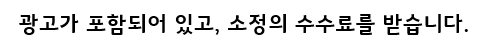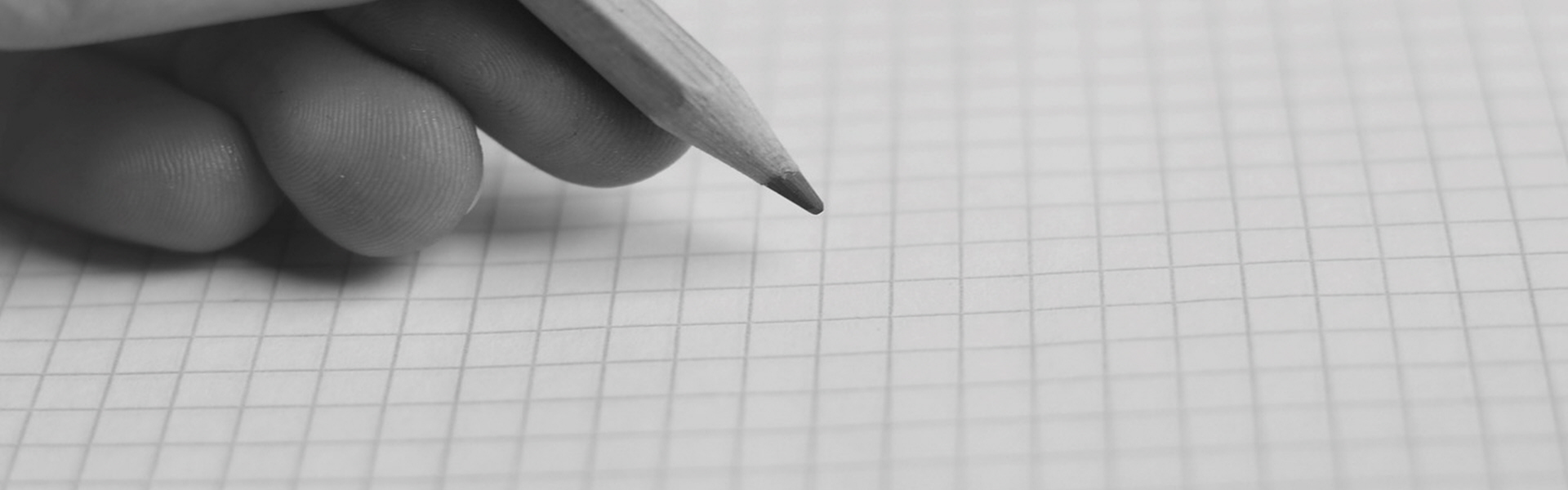정유정 소설가
글 속에서 균형 잡는 법을 알려주세요!
1. 대화에 대하여.
대화와 대사는 다릅니다. 대사는 변형된 묘사 혹은 해설에 해당됩니다.
정보를 주고, 장면의 방향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합니다.
그러므로 소설 속 대화는 당연히 ‘대사’가 되어야 합니다. 우선 일상적인 내용이어서는 안 됩니다.
서술로 표현 가능한 것, 이를 테면, 잘 잤니? 응. 덥지 않았니? 아뇨, 같은 핑퐁식 대화는 대사로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.
더하여 가능한 한 압축돼야 합니다. 짧은 말로 많은 걸 이야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.
대화로만 한 페이지를 채우면 이야기는 가벼워지기 마련입니다.
제 경우는 대사만으로 네 마디 이상을 넘기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.
(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.)
대신 대사 사이사이에 행동과 반응을 끼워 넣어 분위기를 알려주는 방식(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)을 선호합니다.
대사에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.
숨겨져 있던 정보를 알려준다거나, 복선을 깐다거나,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낸다거나…
대사를 장면을 구성해가는 하나의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.
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사는 평범한 대화처럼 들려야 합니다.
자연스러운 구어체와 적절한 생략, 속어(과감하게 쓰세요).
써놓은 다음 스스로 대사를 소리 내 말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연스러운지 아닌지 알게 될 것입니다.
“보통 사람처럼 말하되 현명한 사람처럼 생각하라”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입니다.
2. 묘사에 대하여.
우리 뇌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. 구체적인 이미지로 생각합니다.
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들까지 구체적으로 형상화돼야 합니다.
독자가 막연하게 상상하도록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.
다시 말해, 모든 묘사는 ‘극화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
박범신 선생님이 이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. ‘선명하지 않은 이야기도 선명하게 선명하지 않아야 한다.’
글을 쓰다가 막힐 때 어떻게 하세요?
일차로 도서관에 갑니다. 관련된 분야의 책, 혹은 자료를 뒤지는 거죠.
2차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찾아가 추가 취재를 합니다.
글이 막히는 이유는 대부분 할 말이 없기 때문이고, 할 말이 없는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.
‧₊˚.⋆·ฺ.∗̥✩⁺˚ ੈ‧˚૮꒰˵• ﻌ •˵꒱აੈ✩‧₊˚ੈ*:゚*。.⋆·ฺᐝ.∗̥⁺˚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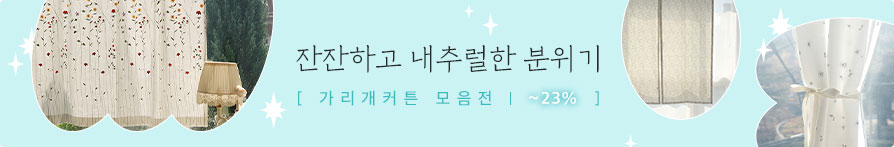


'정보 모음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집에서 5분이면 뚝딱, 홈메이드 각질제거제 만드는 법 5 (0) | 2021.03.15 |
|---|---|
| 캐나다, 존슨앤드존슨 코로나 백신 사용승인 (0) | 2021.03.06 |
| [이벤트] 11/15까지 <엘리자의 내일> 무료 감상 네이버 시리즈 이벤트 (0) | 2019.11.11 |
| 헌법불합치 뜻, 위헌의 뜻이란? (0) | 2019.04.11 |
| [애드센스]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하는 중요한 단어 6개 (0) | 2017.09.22 |
| * 정유정 소설가 * 소설 쓰기가 궁금하다면? 정유정 작가님에게 물어보세요! (4) - 네이버 지식인 (0) | 2017.08.25 |
| * 정유정 소설가 * 소설 쓰기가 궁금하다면? 정유정 작가님에게 물어보세요! (3) - 네이버 지식인 (0) | 2017.08.25 |
| * 정유정 소설가 * 소설 쓰기가 궁금하다면? 정유정 작가님에게 물어보세요! (1) - 네이버 지식인 (0) | 2017.08.25 |